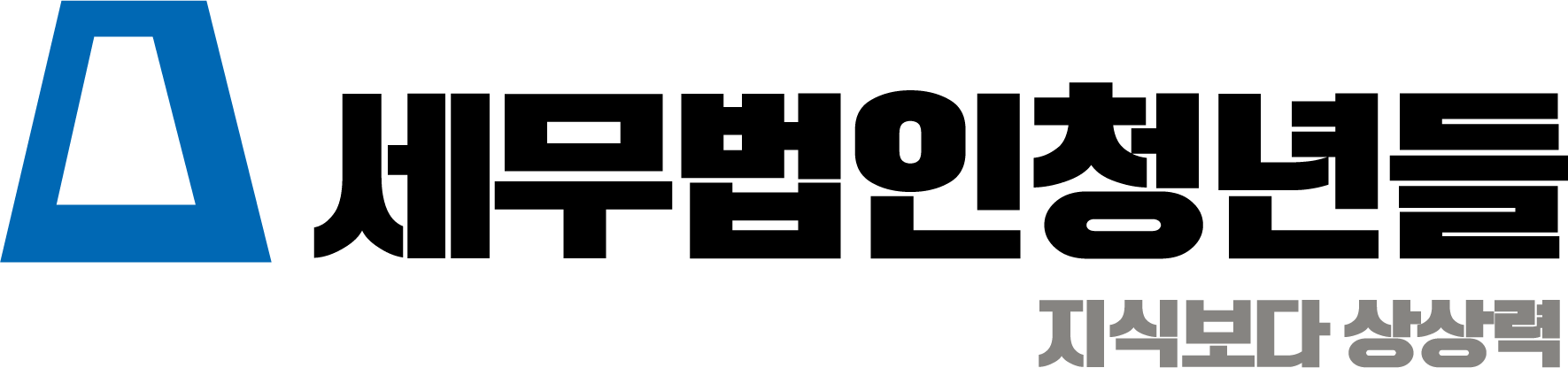군인으로 살다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다.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남성들이 군생활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한 가지 이야깃거리이자 젊은날의 향수로써 공유하고싶어한다는 점이다. 오랜만에 자동차 정비소에 들러서 정비를 하던 중에 아버지뻘 되는 정비사가 말을 걸어왔다. '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'고. 내 머리를 바라보며 묻는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군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. 그 다음은 뻔한 레퍼토리로 군대이야기에 빠져든다. '어디서 근무하셨냐', '몇 년도에 근무하셨냐', '그때 군대에 비하면 요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' 등 진부하지만 한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이 오간다. 내가 간부로 근무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군생활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방식을 듣다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가늠된다. 정확히 말하자면 '조직 내에서의 성격'이다.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. '우리 애는 정말 착하지만 친구를 잘못만나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'같이 말이다.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(?)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일말 부끄럼 없는 사람은 측은하게 느껴지곤 한다.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었을테다. 그 순간에 자각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. 그럼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테니까. 안타깝게도 추억을 소환하는 흥분은 마치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한다. 그 당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나는 다른 입장인데도 말이다.